[함영준의 사람과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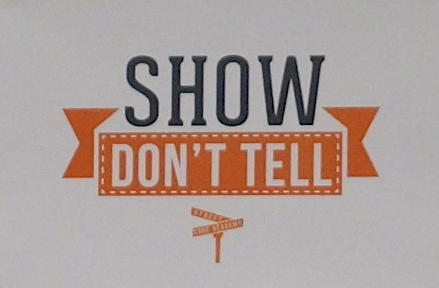
올해부터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말이 점점 많아지고 남을 훈계하려드는 자신을 자주 발견한다. “내가 보는 세상은 이렇다.… 지금 정치판은 이런 점이 틀렸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표현은 점잖다 치더라도 나는 학생들에게 내 견해와 주장을 거침없이 피력하고 있다.
비단 학생들만이 아니다. 이제 60이 다 된 나이라, 만나는 사람 상당 수가 손아래이다 보니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라며 주절주절 말을 늘어놓게 된다. 옛말에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꼭 그런 듯하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나 행동이란 점을 우린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사람을 감동시키는 글 역시 말이 아니라 행간 무언(無言)의 울림에서 나오지 않는가. 그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말이 많은 내 자신이 못마땅하다.

군사독재 시절, 의견 배제하고 ‘보여주는’ 글쓰기 법 배워
내가 기자가 됐던 1980년대 초 신문 산업은 호황기였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신문 부수는 날로 늘어났다. 월급도 대기업보다 많았다. 문제는 언론 자유가 없다는 점이었다.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는 보도되지 못했고 담당 기자나 간부는 기관에 끌려가 ‘봉변’을 당했다.
초년병 시절부터 우리는 사실(fact)과 의견(opinion)을 명확히 구분해 쓸 것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다. ‘화창한 날씨’는 객관적 사실이지만 ‘상쾌한 날씨’는 주관적 의견이다.
군사 독재하에서 우리는 의견은 줄이고, 사실만 보도할 것을 배웠다. 그러나 그마저도 문제될 수 있었다. 고위 공직자 수뢰사건이 정권에 불리하다며 보도 금지가 되고, 부동산 사기 피해자 중에 ‘장군 부인’이 포함된 기사가 나갔다고 군인들이 편집국에 난입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했다.
당국의 검열을 피하면서 국민에게 사실과 정보를 알려 주려면 기자들이 ‘언어의 마술사’가 돼야 했다. 용어나 형용사·부사는 물론 조사까지도 의미를 담아 선택했다. 5공 시절 ‘경제가 좋다’와 ‘경제는 좋다’는 엄연히 다른 말이었다. ‘민감한 상황’을 보도할 때 선배들은 흔히 이렇게 주문했다. “사설 쓰듯 하지 말고 스케치하듯 보여줘(Show, Don’t tell).”
기자가 심판자가 돼 상황을 말하거나 의미를 부여 하지 말고, 관찰자 입장에서 그대로 묘사해주고, 독자가 알아서 판단하게끔 만들라는 주문이었다.
이런 기사 중 압권이 김대중 조선일보 출판국장(현 조선일보 고문)이 쓴 ‘거리의 편집자들’(1984.11.30)이었다.
‘낮 12시쯤의 광화문 지하도는 점심 먹으러 가는 사람, 먹고 나오는 사람들로 언제나 붐빈다…’로 시작되는 이 칼럼은 서슬 시퍼런 검열 하에서 신문 가판원들이 톱기사는 무시한 채 1단짜리 ‘시국 관련 뉴스’에 빨간 줄을 그어 파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당시 암울했던 언론 상황을 자조했다.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결국 그는 정권 압력으로 2년 뒤 외유를 떠났다.
2000년대 중반 신문사를 나와 잠시 대학에서 가르칠 때, 나는 미국 컬럼비아대 교재인 ‘뉴스 보도(News & Reporting)’에서 ‘Show, Don’t tell’에 대한 설명을 발견했다.
“가장 감동적인 글은 필자가 말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보여줄 때 나온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쓰고 나서 한 말이다….”

주장하기보다 ‘경청’을 보여줄 때 소통 이뤄지는 것은 세상 이치
그러나 ‘Show, Don’t tell’이 단순히 글 쓰는 기술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강의 후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였다. 나보다 한 세대 어린 젊은이들과 진정한 소통은 ‘내가 말할 때보다 그들의 말을 들어줄 때’ 이뤄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말을 하면 그들은 수동적이 된다. 그러나 내가 들으면 그들은 적극적이 된다. 나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호의적으로 나온다. 내가 한 일은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준 것(show)뿐이었다.
돌이켜 보면 세상살이 이치(理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보다 사소한 ‘마음’이나 ‘행동’에 더 감동을 받는다. 어렸을 적 시험을 망쳤을 때 어머니가 꾸지람 대신 사준 짜장면 한 그릇, 힘든 이등병 시절 고참이 다가와 말없이 건네준 담배 한 개비, 사건기자 당시 헤매는 나를 삼겹살집으로 데려가 덤덤히 건네주던 선배의 소주잔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후 나는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나 아직도 쉽지 않다. 요즘 강단에 다시 서면서 어느새 비판하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자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사회가 어지러운 것은 항상 그럴듯한 ‘말’만 있을 뿐 걸 맞는 ‘마음’이나 ‘행동’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어쩌면 ‘Show, Don’t tell’이야말로 온갖 주장과 위선(僞善)이 난무하는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인생의 경구(警句)가 아닐까싶다.[오피니언타임스=함영준]

함영준
고려대 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전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비서관
전 조선일보 사회부장·국제부장
| 오피니언타임스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