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 소중한 사람]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며 쓴 우화(寓話)입니다. [편집자 주] |
3년 8개월이 넘는 긴 항해였다.
우린 모두 한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원래 가진 것이 없는 마을이라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맨손으로 나무를 베어다 배를 만들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들이 아파 밤새 끙끙대는 소리를 듣고 컸다. 아픈 건 차라리 나았다. 산에서 나무에 깔리거나, 톱질을 하다가 다리나 손가락을 영영 잃어버린 어른들도 있었다.
그렇게 만든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그 고기를 이웃 마을에 팔면 돈이라는 걸 벌 수 있을 거라고 한 건 선장의 아버지였다. 돈을 벌면 우리가 배를 곯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도 했다. 그래서 어른들은 더 열심히 고기를 잡았다. 그걸 가르쳐줘서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는 다들 무척 고마워했다.
그래서 청년이 된 내게, 우리 아버지는 말했다. 그렇게 이치에 밝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선장도 뭐든 잘 알거라고. 선장을 따라 이 배를 타라고. 이 배는 어른들이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물려준 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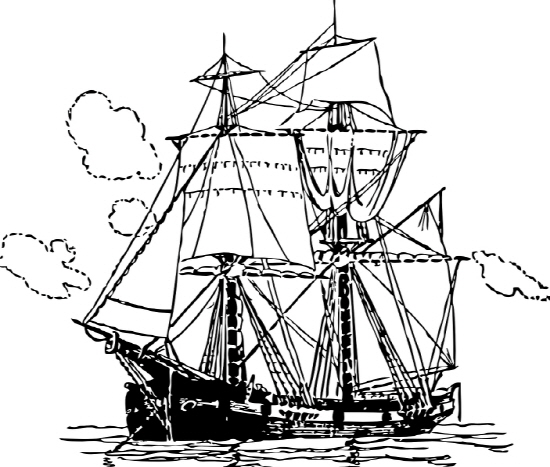
우리는 선장을 믿었다. 그가 배키를 잡았으니 적어도 이 배는 나아가고 있다고 여겼다. 망망대해지만 우리들이 고기를 열심히 잡아서, 고기로 가득찬 배를 끌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일이라고, 우리 모두가 무사하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었다.
선장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선장실 밖으로는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그가 뭔가 중요한 계획이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먼저 했다. 간혹 그가 이상하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수다쟁이들이라고 우리는 그들을 놀리곤 했다.
“선장은 어디서 고기가 잘 잡히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지만, 이상하리만큼 선장이 말하는 곳에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 관광하는 섬 옆에서는 고기가 없을 것 같은데도 그는 고기가 있을 거라고만 했다. 수다쟁이들은 이게 다 선장이 관광하는 취미가 있어서, 매일 밤마다 선장이 그 관광 섬에 다녀오느라 우리 배가 여기 서있는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런 헛소리는 믿지 않았다. 그가 우리에게 있어 고기가 가지는 의미를 잊을 리가 없었다. 관광 같은 사리사욕을 채울 리가 없었다. 그는 우리의 선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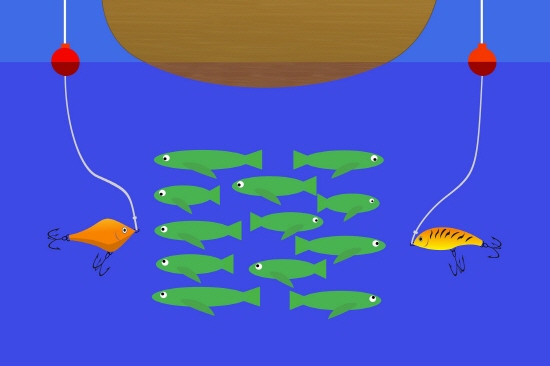
선장은 갑자기 언제부터인가 조업 양을 늘렸다. 그 양에 도달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무서운 말만 자꾸 했다. 해적선이 언제 우리를 괴롭히러 올지 모른다는 말도 했다. 열심히 일해서 고기를 모으면, 일단 그 고기를 무기로 바꿔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차곡차곡 쌓이는 고기를 보면 그래도 힘이 났다. 그 고기는 우리를 지키고,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선장도, 우리도 마을에 삼시세끼 밥 짓는 연기가 항상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믿었다. 그래도 매일 매일 삭신이 아파 잠이 들 수 없었다. 앓는 소리가 숨소리 같았다.
“애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
견습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저기 섬까지만 나갔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수다쟁이들이 소리치고 있었다. 저기 배가 보인다고 해서 보니 조그마한 배 세척이 돌아오고 있었다. 아니, 돌아오려고 했는데,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요 앞에 눈에 보이는데, 가만히 떠있기만 해서 왜 그런가 하고 건넛집 아저씨랑 여럿이 나가서 데리고 오려고 했다. 그런데 선장 무리 몇몇이 조금 나가보더니 곧 올 거란다. 우리가 펄펄 뛰면서, 더 나가보라고 했더니, 조용히 기다리면 데리고 올 거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맹추마냥 기다렸다. 우리도 기다리고, 견습생들도 기다렸다. 가라앉기 시작하는데도 어떻게 해주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맹꽁이였다. 견습생들은 아직 수영하는 법도 잘 모르는 꼬물이 들인데, 아무것도 못해주고 천치처럼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다. 기다리던 선장은 오지 않았다.

나중에 나타난 선장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 바다를 보며 말했다.
“견습생들이 헤엄쳐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선장의 무리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젖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지만 그들은 마른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다. 밤이 되면 흐느끼는 축이나, 서로 싸우는 축이나, 멍한 축이나, 여러 축들로 나누어져 각자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는 노란 개나리꽃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다.
이번에는 선장의 마법사가 우리 배에 같이 타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번에는 아무도 수다쟁이들을 놀리지 않았다. 수다쟁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수상한 마법사를 보았다는 선원도 있었다. 키가 9척도 넘는 거인에 온갖 마법을 부린다고 했다.
마법사는 있었다. 다만 아주 작고 뒤뚱뒤뚱 걸었다. 마법도 부리지 못했으며, 다만 욕심이 많았

다. 식자재 창고 구석에서, 우리가 아껴먹던 싹을 틔운 감자 옆에서, 생전 처음 보는 값비싸 보이는 음식들 사이에서 끌어냈을 때, 마법사는 울었다. 투실투실 살이 오른 열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가 너무 꽉 죄어서 우는 것 같았다. 아니면 다 먹지 못한 음식이 아까워서 우는지도 모르겠다.
“고기가 없어!”
찢어질 것 같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정말 텅 비어 있었다. 삼년 팔개월동안 우리는 썩은 감자를 나눠 먹지, 차마 고기에는 손댈 수 없었다. 고향에 가지고 돌아갈 고기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누이들, 아내와, 아이. 우리는 모두 소중한 누군가가 있었다.
없어진 고기 대신, 마법사의 손가락은 빛이 났다. 선장의 반지들도 우리가 지나쳐온 관광 섬 어딘가에 묻혀서 빛이 난다고 했다. 선장 무리들의 손가락에도 빛이 났다. 지문이 닳아 없어진 내 아버지의 열 손가락을 닮은 내 손으로 선장을 불렀다. 선장은 내 울퉁불퉁한 손끝에라도 닿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우리의 고기는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지만 선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다시 고기를 잡아 집에 가고 싶거든, 기다려 보라고만 했다.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선장실 문을 잠그고, 종이에 그렇게 적어서 문틈으로 내밀었다.

우리는 갑판에 모여 앉아서 선장에게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의 선장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소리치지도, 화가나 울지도 않았다. 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다만 문을 열고 나오라고 했을 뿐이었다. 선장실을 비우고, 배키를 내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곧 우리 중 누군가가 배키를 잡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만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모두 모여 생각해봐야만 했다.
마을에 남아있는 어린 것들이 다시 배를 곯기 전에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만선을 해갔으면 하고 다시 한 번 꿈을 꾸고 싶었다.
“선장은 배를 떠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배안의 모든 생명을 수호하고, 배와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이 선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원들의 고통에도, 방향 잃은 배의 다급함에도, 그의 선장실은 고요와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문을 열고 나와 물러나 달라는 우리에게,
그가 선장실 문틈으로 내밀어 준 쪽지를 선장 무리 중 한명이 배를 부풀리며 자랑스럽게 받아 읽었다.
“선장은 선장실을 떠나지 않는다.” [오피니언타임스=이수진]

이수진
영어강사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합니다.
오피니언타임스 청년칼럼니스트
| 오피니언타임스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