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채연의 물구나무서기]
‘나 수강신청 망했어.’
휴대폰으로 날아온 친구들의 문자 메시지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피시방으로 수강신청 전투에 나간 친구들은 패전병이 되어 돌아왔다. 안타까운 마음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무언가 위로할 수도, 위로해 줄 말도 없었다. 괜찮다고, 다음 학기 수강신청은 잘하면 될 거라고 말했지만 무책임했다. 나는 이들이 망친 이번 학기 시간표를 책임져 줄 수 없었다. 게다가 나 역시 수강신청에 실패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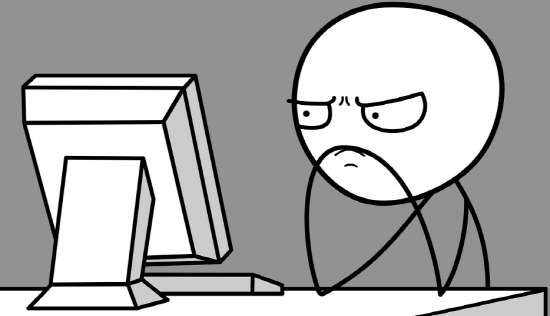
수강신청을 해 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전날부터 혹여 늦게 일어나 듣고싶은 수업을 놓칠까 알람을 여럿 맞춰둔다. 수강신청 삼십분 전부터 페이지를 띄워두고는 초조하게 모니터를 바라본다. 긴장감에 손은 땀으로 축축해지고, 옆에 작게 띄워 둔 초시계의 일 분, 일 초에 예민해진다. 정각이 되기 전 그 고요함. 2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나의 대학생활 한 학기를 걸어야 한다.
결과는 냉혹하다. 누군가는 성공한 자신의 시간표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인원 제한이 떠버린 페이지를 야속하게 바라봐야 한다. 수강신청에 실패했더라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다지 듣고 싶지 않았지만 학점을 채우기 위해 남은 비인기 수업을 신청하거나, 누군가의 수강 취소라는 작은 희망을 걸고 페이지 새로고침을 열심히 누를 뿐이다. 최악의 경우 누군가는 진지하게 휴학을 고려하거나, 필수 이수 과목을 수강하지 못해 한 학기를 더 다니게 될지도 모른다.
대학생은 학기당 300만원 넘는 수업료를 낸다. 학생들은 왜 대학 서비스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배움의 기회를 얻기 위해 이토록 노력하며 낙담해야 하는 걸까. 학생이 수업료를 지불하고도 정작 듣고 싶은 강의는 선택하지 못하는 현실은 꽤나 비극적이다.
수강신청은 학교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시스템이다. 학교는 특정 수업을 개설하고, 각 수업마다 수강생 수를 정하고, 시스템에 이를 올려두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 단점과 피해는 온전한 학생의 몫이다. 특정 수업에 수요가 몰리더라도 결국 들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다. 누군가는 그 수업을 들을 수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듣지 못한다는 말이다.
원하던 수업을 듣지 못하더라도 이는 인기 있는 수업을 듣고자 했던 학생의 잘못이다. 인터넷 오류로 신청이 튕겼다거나 수강신청 페이지가 다운되더라도 그건 운 없는 학생 잘못이다. 학교는 수강신청 시스템의 ‘선착순 제도’ 뒤에 숨어, 학생들이 지불한 수업료에 상응하는 수업을 제공할 권리를 지지 않는다. 수강신청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박탈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는 최소한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을 위한 구제 제도를 가지거나, 사전에 적절한 안전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학생이 수강을 원하는 과목은 반 개설을 늘리거나 수업의 수용 인원을 늘리는 등 유연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듣고 싶었던 수업은 딱 한 개 성공했어요. 재수해서 한 살 더 늦게 시작했는데, 휴학할 수도 없고 참 암담해요. 휴학 사유가 고작 수강신청에 실패해서라면 웃길 것 같고요.
아, 그런데 진짜 시간표가 망해서 휴학했다는 친구를 봤어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맞는 다른 수업을 부랴부랴 신청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수업을 버리길 기다려야죠. 수강신청 기간이 오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박00/22세 대학생
[오피니언타임스=송채연]

송채연
대한민국 218만 대학생 중 한 명.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될래요.
오피니언타임스 청년칼럼니스트.
| 오피니언타임스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