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완의 애, 쎄이!]
[오피니언타임스=우디] 밤 9시 30분이었다.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3통째 이어졌다.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하긴 했지만, 늦은 밤의 전화는 너무하지 않은가. 통화가능 시각은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라고 명시해놓았는데! 3통까지는 그냥 무시 했는데 4통째가 되니 갑자기 화가 치솟아 전화를 받았다. 상대는 굉장히 밝은 목소리의 여성이었다. 그런데 ‘이력서 보고 연락을 드렸어요’라고 시작되는 얘기는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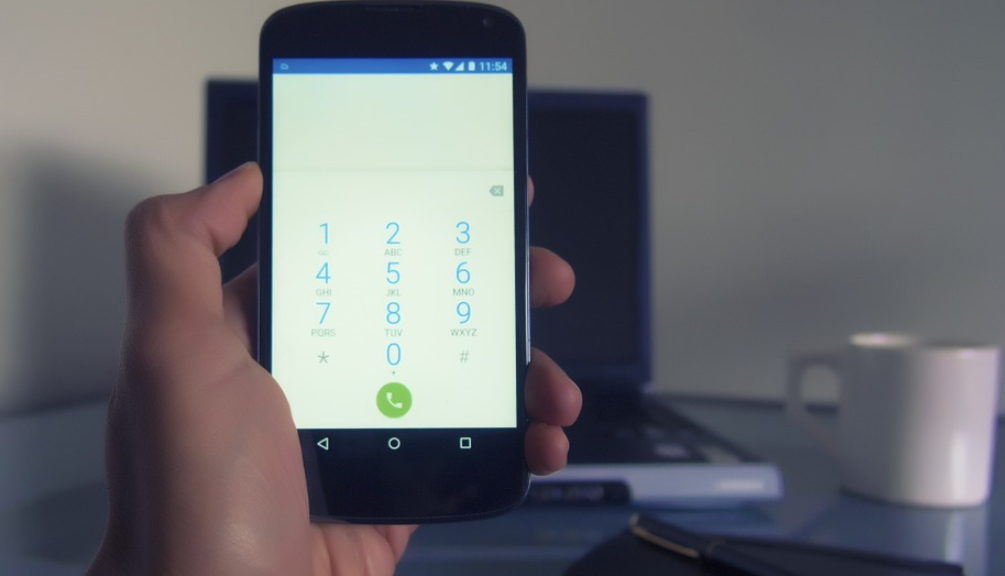
“사진이 정말 밝고 예쁘셔서 전화 드렸는데, 어, 음, 목소리가 굉장히… 낮으시네요.” 약간의 미안함과 실망이 뒤섞여 있는 목소리였다.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에 낯선 이의 전화를 받은 내 속도 모른 채, 상대는 계속 말을 망설였다. 예상은 했지만 벌써 오늘 하루에만 여러 번 제의를 받은 학습지회사였다. 내 현재 상황과도 맞지 않고, 아이들과 좋은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내가 그리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거절해왔던 그곳의 또 다른 지부였다. 통화는 그렇게 끝날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여자가 다시 말을 건넸다.
“저도, 문예창작학과 졸업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끌린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이 사람이다 싶은. 문창과 정말 취업 안 되죠? 제가 알아요. 정말 힘들더라구요.”
여자는 계속해서 나의 힘듦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는 듯, 원치도 않은 위로를 건넸다. 학과의 전문성이 없는 것, 취업에 적합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것, 뭔가 본인의 한탄을 하듯 내게 주저리주저리 이야기를 풀었다. 나는 그냥 아, 네, 그렇죠, 라고 했다. 동의할 수 없는 내용도 몇 개 있긴 했지만. 끝날 듯한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뭔가 내가 먼저 끝을 맺어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지금 장기간 근로를 할 수 없고, 내년에 해외를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다.
“아 진짜요? 어학연수 가시는 건가요? 어디로 가시나요? 아, 저도 6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갔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 같아요. 아, 진짜 부럽다.”
이야기가 이즈음 흐르니 이 사람은 내게 채용을 권하는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문창과라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더 쓰이고 그래요. 진짜. 저도 문창과를 나왔으니까요.”
여자는 점점 나를 본인의 가장 가까운 후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자신이 이겨낸 역경들을 내게 풀어내보고 싶은 듯 얘기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에 응할 상황이 아니었다. 당장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이력서 넣은 곳에서는 연락이 안 오고, 보험회사에서나 연락오고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에 계속 원치 않는 전화에 시달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갑의 따뜻한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지쳐있었다. 혹시 나중에라도 관심이 생긴다면 연락을 달라며 여자는 전화를 끊었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답도 없는 막막함과 서러움이 몰려왔다. 네가 뭘 이해하려고 해. 입에서 욕지기가 끌어오르는 느낌이었다.

나는 5년간의 알바 경험이 있는데, 그 시절이 즐겁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힘들었던 경험이 많았다. 이리 치이고 저리 깨져서 겪지 않아도 될 경험까지 두루 겪은 뒤에야 세상이 결코 녹록치 않은 걸 깨달았다. 20대 초반의 내가 그 여자의 전화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봤다. 여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아마 기분 좋게 전화를 받고, 사진 속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라는 말에 혹 해서 어깨를 으쓱였을 것이다. 나의 다양한 경력을 얘기할 때 ‘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습니다’라고 선수를 쳐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 사람이 편안하게 건네는 말이나 위로에 일찍이 마음이 동해서 흔들렸을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어떤 말에도 마음이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정말 순수한 호의에도 의심을 하게 됐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보여준다면 그것은 내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이고, 그 원하는 것을 건네야 할 때의 나는 상대방보다 약자인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 사람은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가장 필요한 걸 건넨 사람일테니까. 이런 공식을 모든 관계에 대입할 순 없지만, 적어도 나를 채용하려는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거의 들어맞는 편이었다. 언제나 나는 을이었다.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기우는 나의 모습을 조금 멀찍이서 바라보자 입안이 모래를 삼킨 듯 껄끄러워졌다. 너무 많이 다치고, 닫혀버렸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20살이 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자잘한 알바의 경험들이 시작된다. 누군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떤 이는 용돈벌이를 위해 시작한다. 그냥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내 친구들도 다양한 알바를 했었다. 20대 초반의 우린 카페와 술집에서 수천 번이나 일하는 곳의 사장이나 매니저를 잘근잘근 씹었다. 사소하게 혼나서 그들을 씹기도 했지만 우린 항상 지치고 지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그들을 말로만 씹어댔다. 좋은 상사도 드물고, 좋은 동료도 드문 사회였다. 나 또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고 경계하다보니, 좋은 직원이 될 수 없었고 좋은 동료가 될 수 없었다. 사회의 첫 걸음인 아르바이트부터 지쳐버렸었다.
나는 아직 이력서를 100군데에도 넣어보지 않았고, 하루에 면접 세 군데를 뛰어보지도 않았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보지 않았다. 예전에 장기적인 일을 잡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구할 때 30곳 조금 안 되는 곳에 이력서를 넣어본 것이 전부였다. ‘일 구하기 힘들다’고 툴툴대는 내게 친구들은 벌써 지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력서를 넣어둔 곳을 일일이 세지 마라, 서류통과 되어도 면접은 더욱 힘들 거고, 면접을 볼 때 모욕적일 때도 많을 거고……. 회사를 들어간다고 해도, 나아지는 것도 없을 거고. 친구들과 나는 20대 초반 때처럼 또 우울한 표정을 하면서 입을 닫았다. 이젠 더 이상 무얼 말하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다. 지치고 지친 느낌이었다. 밤. 밤. 밤. 밤. 마치 끝나지 않는 어떤 새카만 밤에 갇힌 것만 같다. 우린 언제쯤 편안히 잠을 청할까.

우디
여행, 영화, 글을 좋아하는 쌀벌레 글쟁이.
글을 공부하고, 일상을 공부합니다.
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지향합니다.
오피니언타임스 청년칼럼니스트
| 오피니언타임스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