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화의 요즘론]
[오피니언타임스=허승화] 나는 그만큼 자유로울 자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며 내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멈춰 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느새 멈춰 서고 마는 것. 잠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잠들어 버리는 것.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만 할 수 없는 것. 늘 커다란 간극이 있는 이성과 본능 사이. 빈 페이지는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한다. 아니, 하는 것 같다.
빈 페이지를 마주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잠시 마음이 착잡해 졌다가 이내 호흡이 곤란해지기도 한다.
가끔은 비어있는 순백의 페이지가 내 머릿속을 제멋대로 휘젓고 다니는데도 넋을 놓고 있을 때도 있다.
빈 페이지는 내가 아직 낳지 않은 자식 같다.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책임질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고 아득해 진다. 나는 누군가의 자식이던 경험만 있지, 누군가의 부모가 될 준비는 해본 적이 없다.
준비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막연한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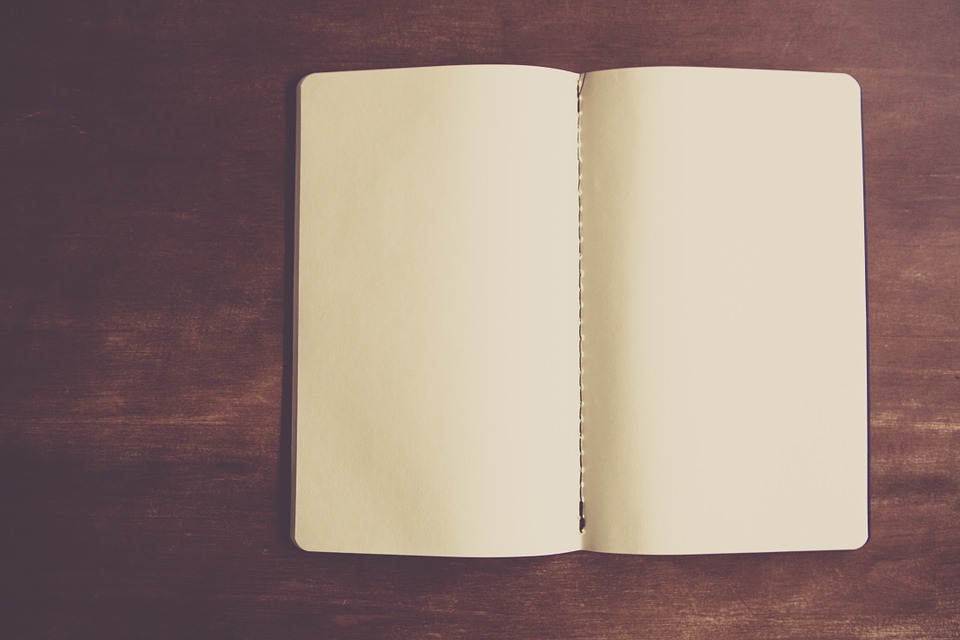
빈 페이지를 마주할 용기를 내는 것은 어렵다. 나는 숨을 고른 후에 빈 페이지를 열어 제낀다. 조금 전까지 빈 페이지에 무언가 쓰여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다. 내가 잠결에라도 무언가 써 놓지 않았을까. 그러나 빈 페이지에는 몇 날 며칠까지 써야한다는 무책임한 말이 적혀 있을 뿐이다. 나는 써야 하고 페이지는 아직도 비어있다.
내가 쓰지 않는 한 페이지는 채워지지 않는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가끔은 당연한 말이 태어나 처음으로 듣는 것처럼 생경할 때가 있다. 그것은, 내가 버릇처럼 생각하고 입 밖으로 꺼내면서도 단 한번도 그 말을 곱씹어 보지 않았기에 생기는 이질감이다.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내가 해리포터가 아닌 이상, 모든 것은 남의 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하긴, 해리포터도 글은 자기가 쓴다.
빈 페이지의 다른 말은 자유다. 자유는 불안을 낳는다. 컴퓨터 속에서 표백제를 쓴 듯 하얗게 자리하고 있는 텅 빈 페이지는 불안하게 자유로운 공간이다. 나는 그 안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세련된 문장을 구사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역시 믿을 수 없을만큼 제멋대로 쓰여서 나조차도 뜻을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써낼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있는 힘껏 갈팡질팡 한다.
언젠가 미국 작가 커트 보네거트가 자신의 소설에서 글을 쓰는 사람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글을 엄청나게 빨리 쓰고 많이 고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글을 한 문장씩 무척 느리게 쓰고 덜 고치는 유형이다. 보네거트는 뒤에 여성 작가는 대부분 전자, 대부분의 후자는 남성 작가라는 사족을 덧붙였다. 나는 여성이고 공교롭게도 전자에 속한다. 그렇기에 나는 손가락을 운동시키듯 글을 썼다.
어릴 적부터 어떤 형태, 내용이든 분간 않고 일단 쓰고 봤다. 생각을 하기 전에 글이 먼저 나와있는 식이었는데 뭐라도 일단 쓰고 고치자고 생각했기에 그럴 수 있었다. 무언가를 쓰는 게 크게 두렵지 않았다. ‘지금 뭐 먹고 싶은지’ 라도 쓰다 보면 어떻게든 글은 완성되어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글을 쓰는 속도가 점점 예전만 못하게 되고 있다. 바뀐 계기는 크게 없다. 이게 무슨 일일까.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일까. 아니면 사람이 점점 진득해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더 이상 무언갈 쓰기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일까.
예전의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솔직했다. 안네의 일기를 쓴 안네 프랑크 처럼, 누가 볼 지도 모른다는 생각 없이 그저 썼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글에 독자가 생길 지도 모른다는 염두 아래 모든 글이 잘 흘러가지 않게 되어 버렸다. 몇 번의 정체를 경험한 뒤에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또 다시 그런 정체를 경험하게 되면 절망하게 되거나 더 이상 못 쓰게 될 까봐 무서웠다. 글만 쓰려고 하면 답답해졌다. 글쓰는 것을 계속 미뤘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나는 내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갔고,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속였다. 아니야, 글 쓰는 것은 무서워. 그만 해, 속으로 되뇌였다.
검열은 소설 <1984> 속 전체주의 국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 마음 속에도 큰 거름망이 있다. 너무 오래 써서 기능이 썩 좋지 못한 그 거름망을 이제는 교체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내가 나를 제대로 거르지 못한 지 꽤 된 느낌이 든다.
자기검열의 늪에 빠지는 순간 한낱 메시지를 쓰는 것조차 어려워지기도 한다. 모든 빈 페이지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다. 기어코 이번에도 빈 페이지를 채우고야 말았지만...

허승화
영화과 졸업 후 아직은 글과 영화에 접속되어 산다.
서울 시민이다.
오피니언타임스 청년칼럼니스트
| 오피니언타임스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