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복의 잡설]
[논객칼럼=김부복] 앞니 하나가 설쳐댔다. 천방지축이었다. 전후좌우로 마구 흔들거렸다.
녀석은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깝죽거렸다. 잇몸을 자기 멋대로 치받았다. 주인을 짜증나고 신경질 나게 만들었다.
녀석은 주인이 싫어하는 것도 아랑곳없었다. 주인의 마음과는 따로 놀았다. ‘이질감’이 대단한 녀석이었다. 마치 주인을 무시하는 듯했다.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녀석을 혀로 밀쳐댔다. 하찮은 녀석과 ‘설전(舌戰)’이었다. 손가락으로 꾹꾹 쥐어박기도 했다. 치열한 싸움이었다.
녀석은 끈질겼다. 그렇게 압박을 해도 잇몸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텼다. 도대체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녀석이었다. 아마도 주인을 한없이 불편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하지만 녀석에게도 한계는 있었다. 악착같던 녀석이 주인의 혀에 밀리는 듯싶더니 순식간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알고 보니 무기력한 녀석이었다. 힘도 대단치 않으면서 주인을 괴롭히며 온갖 폼을 다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앞니를 잃은 주인은 뭔가 허전했다. 조선 때 선비 김창흡(金昌翕·1653∼1722)이 이를 잃고 쓴 글을 ‘검색’해 봤다.
“앞니 한 개가 까닭 없이 빠져나가니 입술은 일그러지고 말이 새어 나왔으며 얼굴까지 한쪽이 비뚤어졌다.… 책을 펴고 읽기 시작하자 이가 빠져 벌어진 입 사이로 흘러나오는 소리가 마치 깨진 종 같아서… 맑고 흐린소리가 구분되지 않으며 소리의 높낮이도 분간할 수 없었다.…”
주인도 김창흡과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발음이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상대방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었다. 통통했던 얼굴이 홀쭉해진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렇지만, 김창흡은 선비였다. 이 좀 잃었다고 흐트러질 수는 없었다. 스스로를 가다듬었다.
“모양이 일그러졌으니 조용히 들어앉아 분수를 지켜야 하고, 말소리가 새니 함부로 떠들지 말아야 하며, 고기를 씹기 어려우니 부드러운 ‘물음식’을 먹어야 하며,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지 못하니 그냥 마음속으로나 읽어야겠구나.…”
김창흡은 앞니가 ‘까닭 없이’ 빠졌다고 했지만, 다산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경우는 잇몸이 뒤틀리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치통이 심했던 듯싶었다.
“한참 흔들거릴 때에는(方其動搖時) 가시에 찔린 듯 시리고 아팠고(酸痛劇芒刺), 침을 놓고 뜸질을 해도 효과가 없어서(鍼灸意無靈) 눈물을 찔끔거릴 정도로 쑤셨다(鑽鑿時出淚).…”
하지만 이를 잃고 난 뒤에는 되레 홀가분했다. 그래서인지, 이 없는 것을 ‘늙은이의 즐거움(老人一快事)’이라고 자위하고 있었다.
“절반만 빠지면 참으로 고통스럽지만(半落誠可苦) 완전히 없어지니 마음이 편해져서(全空乃得意), 이제는 걱정 없이(如今百不憂) 밤새 잠을 편하게 이룰 수 있게 되었다(穩帖終宵睡).”
이가 없으면 먹는 게 거북해질 수밖에 없다. 우물거리는 바람에 음식 먹는 속도도 뚝 떨어지기 마련이다.
실학자 성호 이익(李瀷 1681∼1763)은 ‘노인십요(老人十拗)’라는 글을 썼다. ‘늙은이의 10가지 껄끄러움’이다. 그 10가지 가운데 이 빠진 껄끄러움을 이렇게 적었다.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喫肉肚裡無), 모두 이 사이에 끼고 마는구나(總在牙縫裡).”
이가 ‘도미노 현상’처럼 차례차례 빠지고 나면, 남은 이가 빠진 이보다 적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선비 조태채(趙泰采∙1660∼1722)는 ‘탄쇠(歎衰)’라는 글에서 털어놨다. ‘노쇠함을 탄식하는 글’이다.
“병든 이가 남아봐야 몇 개나 되겠는가(病齒時存凡幾箇), 머리가 빠졌으니 몇 가닥이나 남았겠나(衰毛日落許多莖).”
몇 해 전, 서울성모병원 교수팀이 ‘잔존 치아 개수’를 조사해서 발표했다. 19세 이상 성인 3만2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자료였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45.1세라고 했는데, 잔존 치아는 24.7개에 불과했다. 사랑니까지 32개의 이 가운데 10개 가까이를 잃은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잔존 치아는 ▲50대 24.3개 ▲60대 20.6개 ▲70대 이상 13.4개였다. 늙을수록 남은 이가 적었다.
그렇더라도 ‘수지부모(受之父母)한 신체발부(身體髮膚)’라고 했다. 흔들리는 ‘이빨과의 투쟁’이 지겹기도 했다. 그래서 ‘이빨 사수 작전’을 시도했다.
우선 잇몸에 좋다는 약을 먹어봤다. 돈을 제법 들였다. 그러나 효과는 ‘꽝’이었다. 이는 여전히 ‘도미노’였다.
소금을 하루에 30분씩 한입 가득 물고 있어도 ‘헛수고’였다. 그래도 ‘도미노’였다.
별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봤다. ‘나무 태운 재를 소금물에 타서 물고 있으면 된다’는 옛 처방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방법 역시 ‘별무 효과’였다.
누군가의 귀띔을 믿고 ‘휘발유’로 입을 가시는 ‘원시적인 방법’도 동원했다. 그랬더니 웬걸. 되레 잇몸이 망가지는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다.
결국 ‘이빨 사수 작전’은 실패였다. ‘잔존 치아’도 따라서 끔찍해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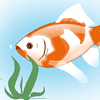
김부복
| 오피니언타임스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ews34567@opiniontimes.co.kr)도 보장합니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