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복의 잡설]
[논객칼럼=김부복]
매천 황현(黃玹∙1855∼1910)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나오는 얘기다.
“남인 최우형(崔遇亨)은 잇달아 청직(淸職)에 발탁되어 이조판서, 홍문관제학, 봉군 등의 요직을 거쳐 충훈부까지 관장하고 있었다. 그는 일찍 수레를 타고 북촌(北村)에 도착하여 코를 가리며, ‘노론의 냄새가 어찌 이리 고약한가’ 하였다. 서울의 대로인 종각 이북을 북촌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노론이 살았다. 그 남쪽은 남촌이라고 하는데 소론 이하 삼색당(三色黨)이 살고 있었다.”
황현은 나라가 기울던 조선 말 사람이었다. 당시 고위층에 있다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이랬다.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려볼 생각은커녕, 당쟁을 일삼고 있었다. 상대편의 냄새조차 싫다며 기피하고 있었다. 냄새가 싫어서인지 서로 사는 동네까지 달리하고 있었다.
사는 곳뿐 아니라, 옷차림도 달랐다. 노론은 저고리 깃과 섶을 둥글게 접었다. 소론은 모나게 접었다. 그 아내들의 옷차림도 남편을 따르고 있었다. 노론의 여성은 치마 주름을 굵게 했다. 소론의 여성은 치마 주름을 가늘게 했다.
말투마저 달라서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왕래하는 일도 드물었다. ‘소통’도, ‘상생’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랬으니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딴 나라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임금도 예외가 아니었다. ‘매천야록’에 따르면, 고종 임금은 스스로를 노론으로 자처하면서 신하들을 삼색(三色)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노론은 ‘친구’라고 부르고, 소론일 경우는 ‘저쪽’이라고 했다. 남인이나 북인의 경우에는 ‘그놈’이라고 지칭했다.
실학자 성호 이익(李瀷∙1681∼1763)은 진작부터 그 ‘딴 나라 현상’을 개탄하고 있었다.
“…하나가 갈려 둘이 되고, 둘이 갈려 넷이 되고, 넷이 갈려 또 여덟이 되었으며, 대대로 이어져 구름처럼 불어났다...한 동네에 살면서도 늙어죽을 때까지 왕래가 없다. 길한 일, 흉한 일에 조문을 가면 다른 당파 사람과 내통한다고 비방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 무리 지어 모여서 배척하고 공박한다. 언동과 의복까지 다르게 하기 때문에 길에서 만나도 뚜렷이 알아볼 수 있으니 풍속이 ‘딴 나라 사람’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왕통’을 이을 원자(元子)를 얻는 것은 나라의 경사였다. 원자가 태어나면 옥에 갇혀 있던 죄수를 풀어주고, ‘특별 과거’를 시행해서 경축했다.
숙종 임금은 어렵게 득남할 수 있었다. 첫 왕비 인경왕후와, 두 번째 왕비 인현왕후에게서는 아들을 얻을 수 없었다. ‘장희빈’을 만나고 나서야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당쟁은 임금의 득남을 경사로 여기지 않았다. 아이는 ‘남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태어나야 했다. 아이의 어머니가 남인이기 때문에 아이 역시 남인이어야 했다. 극심한 당쟁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까지 편을 가르고 있었다.
성호 이익은 당쟁으로 편이 갈라지는 이유를 이해타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무릇 이(利)가 하나인데 사람이 둘이면 당(黨)이 둘이 되고, 이가 하나인데 사람이 넷이면 당이 넷이 되는 것이니, 이가 고정되어 있고 사람만 많아지면 십붕팔당(十朋八黨)으로 가지가 많아지는 법이다.…”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조사가 있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지난달 성인남녀 2232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90.2%가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매우 그렇다’ 42%, ‘그렇다’ 48.2%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8%에 불과했다. ‘전업주부’가 97.2%로 가장 잘 준수하고 있다는 조사였다.
그렇지만,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야 좋을 ‘거리두기’도 있다. ‘정치적 거리두기’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유전자’ 덕분인지 ‘정치적 거리두기’는 그만둘 마음들이 없다. 성호 이익의 지적처럼, 총선을 앞두고 갈라지더니,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삿대질을 하며 흩어지고 있다.
더 있다. 언론은 언제부터인지 ‘진보언론, 보수언론’으로 ‘언론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보도에 ‘거리’를 두고 있다. 그 거리를 좁힐 마음들은 없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마저 정권에 따라 ‘좌향좌, 우향우’다. 그 바람에 아이들도 판단이 헷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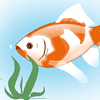
김부복
| 오피니언타임스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ews34567@opiniontimes.co.kr)도 보장합니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