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형의 비틀어보기]
[청년칼럼=우달]
누구나 생존을 위해 매일같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우리가 일상이라 부르는 것이다. 일상은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밥을 먹고, 밥을 벌고, 다음 밥벌이를 위해 잠시 쉬는 일. 심히 간추린 것 같지만 실상이다. 꿈 없인 생존할 수 있지만 밥 없인 살아갈 수 없다. 생명체로서 별 수 없는 숙명이다. ‘인간과 짐승이 다를 게 뭐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은 나란히 땅을 짚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별 탈 없이, 좋을 것도 싫을 것도 없이 단순한 일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어떨까. 생을 다할 때까지 밥벌이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나날이 밥걱정을 해야 하는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체들이 아마 두 손, 두 발, 두 이파리 모두 들고 반길 것이다. 단 하나의 종만 제외하고 말이다.
인간이라는 종족은 참 특이하다. 어느 생물보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단지 지루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한순간에 내던지기도 한다.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기를 반복하는, 여느 생명체들이 아무렇지 않아 하는 일반적인 행태를 죽도록 견디지 못해 한다. 특히 권태가 일상으로 문득 잠입해오는 순간에는 생의 의미마저 잃는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일상을 위협한다. 스스로 지루해하지 않도록 아슬아슬한 줄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지켜보기를 즐긴다.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는 아슬함 속에서 가까스로 일상의 가치를 깨닫는다. 이를 두고 용기가 가상하다고 해야 하는 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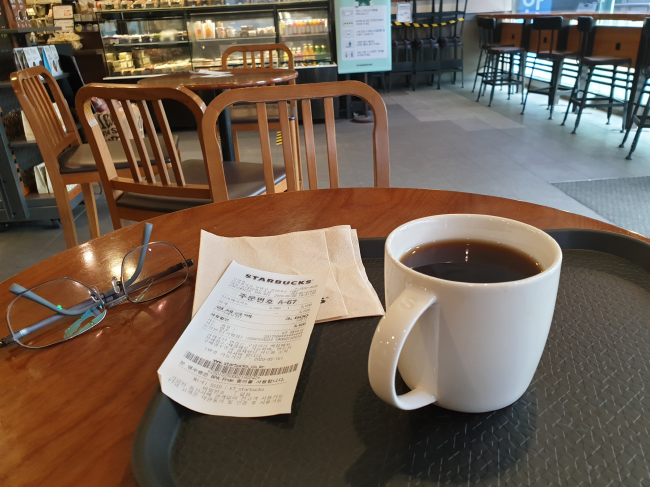
하지만 우리가 굳이 소속된 터전을 박차고 떠나거나, 전에 없던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아도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은 무턱대고 우리를 찾아온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이다. 이를 두고 ‘뜻밖의 사건’이라던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저 일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비일상’이라 칭하려 한다.
‘비일상’이라는 존재는 참 흥미롭다. 대체로 비일상은 일상을 한층 윤택하게 한다. 비일상을 통해 비로소 일상의 가치를 체감하는 인간은, 비일상이 “너, 그러다 그 소중한 일상 잃는다?” 하면 그제야 “아 맞다, 내 소중한 일상” 한다. 부재가 존재를 증명하는 셈이다. 그러나 어떤 비일상은 일상과의 경계를 허물고 서서히 세력을 넓혀간다. 한낱 비일상이 더는 비일상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다. 비일상은 그렇게 또 하나의 일상으로 탈바꿈한다.
몇 년 전부터 YOLO의 바람이 불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때려치웠다든지, 내친김에 다 정리하고 해외로 왔다는 식의 탈(脫) 일상 경험담들이 부쩍 인기를 얻고 있다. 그걸 보며 ‘나도 정말 전부 다 던져버리고 떠날까’ 하며 고민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이 시대에는 돈키호테가 너무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도 저렇게도 멋있게 살아보는 거지’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창을 꼬나쥐고 말을 타고 나서는 모험담은 얼마나 매력적인가. 하지만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돈키호테가 될 필요는 없다. 돈키호테는 결국 비극이기 때문이다.
두 갈림길 앞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지만, 분명하게 일러두고 싶은 건, 그럼에도 지금껏 꾸려온 우리의 일상은 소중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나는 이 지루한 일상을 위해 부단히 살아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독 이러한 추세가 최근에 돋보이는 건, 현대의 삶이 과거의 삶보다 월등히 재미가 없어졌기 때문인지, 단지 현대인들이 더 큰 자극에 익숙해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무턱대고 모두가 현재의 안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의 안락은 누가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일까.
YOLO라는 말이 처음 유행할 때부터 짐짓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그건 근시안적 낙관주의에 지나지 않아” 라고 두 눈을 반짝이며 말하던 한 친구가 생각난다. 근시안적 낙관주의라니. 그렇게 겉멋이 잔뜩 든 근사한 말은 그때 처음 들었다. 아마 세상에서 그 친구만 쓰는 말일 것이다. 이제는 나도 가끔씩 쓰게 되었지만, 어찌 됐든 그 이후로 나는 근시안적 낙관주의에 대해 꽤 오랫동안 고민하게 되었다.
어느 날 비일상이 문득 일상이 되고, 그런 일상이 얼마간 계속되다 다시 돌아왔을 때, 과연 내게 남아있는 건 무엇이고 나의 일상은 어떤 모양일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봄직하다.

우달
우리가 자칫 흘려보낸 것들에 대해 쓰겠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모르는 걸 사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 오피니언타임스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ews34567@opiniontimes.co.kr)도 보장합니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