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는 시대의 세태와 요구를 반영한다. 그래서 아무리 명작 드라마라도 시간이 꽤 지난 후 보면, 어딘가 지금의 문화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영 어색해 때론 유치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건 그 시대에만 느낄 수 있는 정취가 드라마에 담겼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시대를 불문하고 드라마 주인공의 직업으로 작가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법조계 종사자와 의료계 종사자다. 이는 한국 사회 단면에 이들이 최상위에 있는 '엘리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조 드라마나 의학 드라마는 아무래도 레퍼런스도 많고, 극적인 요소가 많기에 크게 실패할 일이 없다. 매번 다루지만, 여전히 대중들에게는 베일이 쌓인 법조인과 의료인의 모습은 호기심의 대상이다.
범죄를 다루는 법조 드라마와 사람의 생명의 다루는 의학 드라마는 그 자체로도 이미 풍성한 이야깃거리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때론 이런 극적 요소가 함정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 많은 레퍼런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캐릭터와 참신한 플롯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비슷한 스토리와 변주된 캐릭터들이 여러 드라마를 통해 배우의 면면만 바뀐 채 재탄생하기도 한다.
두 드라마 가운데 특히 의학 드라마의 경우가 조금 더 전형성을 띠기 쉽다. 몇몇 드라마는 의사란 직업에 대한 환상을 깨려 노력했지만, 결국 사람을 생명을 살린다는 의사의 사명감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순백'으로 표현되는 의사의 숭고함과 사명감이라는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하기엔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정치권과 엮어 비판하기 쉬운 법조 드라마가 그나마 의학 드라마에 비해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그야말로 '성역'이나 다름없다. 앞선 논의의 연장에서 직업으로서의 검사와 의사의 애환 등을 다룬 드라마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직업적인 모습의 검사와 의사를 드라마를 통해 다루는 것이 딱히 재미있을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드라마에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극적 요소를 기대하지, 아무도 현재 나 자신이 마주한 현실적 모습을 기대하진 않는다. 그나마 법조 드라마는 변호사나 판사, 검사, 형사 등을 다루며 다양한 변주를 통해 탄생했지만, 의학 드라마는 아직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하얀거탑' 등이 의료계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다루었지만, 그것도 결국 지리멸렬한 권선징악의 형태로 마무리됐다. '비밀의숲'을 집필한 이수연 작가가 '라이프'를 통해 한국 의료 현실을 다루려 했지만, 결국 '비밀의숲'과 달리 용두사미로 드라마가 끝나 버려 이도 저도 아닌 맹탕이 되고 말았다. 이후 만들어진 의학 드라마 또한 소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충실한 의사들만 주야장천 다뤘을 뿐이다.
이렇게 의학 드라마가 그저 전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생명과 관련한 직종이라는 점에서 결국 허투루 묘사하거나, 지나치게 의사에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대중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어서다. 두 번째는 결국 의사란 직업 자체가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그야말로 '성역'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참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의정 갈등'만 보더라도 그렇다.수많은 정치권의 비판과 대중들의 비판에도 결국 의정 갈등에서 의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리를 찾았다. 물론 그로 인해 이미지의 흠집은 좀 생겼다. 하지만 이는 흉터가 아닌 영광의 상처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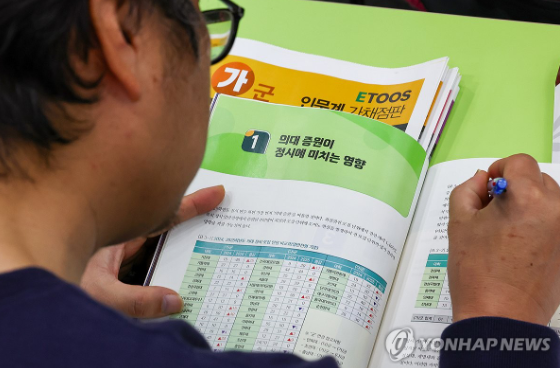
이런 모습 때문인지 몰라도, 한국 최고의 부자들이 살고 있다는 강남의 학원가에 다니는 학생들의 목표는 대부분 '의대 진학'이다. 학생의 꿈인지, 부모의 목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그야말로 0.1% 엘리트들은 대부분 의대에 입학한다. 심지어 더 좋은 의대를 가기 위해 지방 의대를 다니다 수도권 의대로 이동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작금의 한국 풍토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 전 방영한 KBS 다큐멘터리였다. 총 2부작으로 만든 이 다큐멘터리는 '공대에 미친 중국과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조금은 원색적인 제목으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다뤘다.
이 다큐멘터리는 언론에서도 다루며 꽤 많은 반향을 끌어냈다. 하지만 결국 문제 제기만 할 뿐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럴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중국의 AI와 로봇 산업의 발전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한국 사회도 변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나 혹은 내 자식의 일은 아니라는 인식이 그 기저에 있다.
여기에 이미 레드 카펫이 깔린 장밋빛 미래를 포기하고, 험난한 가시밭길을 선택하기엔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도 하다. 나아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자격증으로 반영구적인 의사 면허를 포기한다는 건 그야말로 미친 짓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 '의대' 선택의 이면에는 다큐멘터리에서는 다루지 않은 슬픈 현실이 하나 더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 의대에 간다고 해도 이들이 결코 드라마에서 주로 다루는 주인공의 전공인 심장외과나 응급의학과 등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은 그 어떤 의학 드라마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 오히려 그런 선택을 다룬 의사들을 다루면서 '낭만'이라든가, '슬기롭다'등의 표현으로 그 본질을 호도하기도 한다.
이런 드라마 생태계를 보면서 문득 20여년 전 꽤 재미있게 본 드라마 한 편이 생각났다. 그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가 아닌, 당시 공대생, 그리고 과학자들을 흥미롭게 다룬 드라마였다. 그렇다. 바로 '카이스트'다. 당시 SBS에서 방영한 카이스트는 시청률도 좋았고, 화제성도 높았다. 많은 이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카이스트 지망했고, 과학자를 꿈꿨다. 몇몇 이들은 프로그래머나 해커를 꿈꾸기도 했다. 실제 당시에는 벤처 열풍을 타고 '공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꽤 좋던 시절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더 흐른 지금은 어떤가? 카이스트 이후 그 어떤 드라마도 '과학자'를 다루지 않는다. 간혹가다 '과학자'나 '공학도'가 드라마에 나오는 모습은 더 참담하다. 일부 드라마에서는 이들을 좋게 말해 '너드'와 같은 모습의 소모성 캐릭터로 다룰 뿐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대, 공대생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브랜딩 돼 있는 탓이다.
결국 미디어는 작금의 세태를 반영한다. 예나 지금이나 드라마를 비롯한 미디어에서는 의사를 자꾸만 성직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포장이라는 표현처럼, 그것이 의사란 직업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현실서 마주한 의사들은 오히려 엄연한 전문직이자,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그들에게 자꾸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정의의 사도나 백의의 천사와 같은 모습을 부여하면서 환상을 쌓으면 안 된다. 아무리 드라마가 허구라고 해도 말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의정 갈등 속에서 의사를 비판한 점만 봐도 그렇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의사들이 사명감이 없다거나 돈만 밝히는 생활인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도 인간적인 고뇌와 고민을 하는 하나의 인격체이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드라마에서 '의사'란 직업을 가진 캐릭터에 지나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미화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과잉된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병을 치료하는 의사란 직업은 분명 숭고하다. 하지만 사람의 꿈을 현실화하고 상상력을 키우는 과학자란 직업도 낭만적일 수 있고, 숭고할 수 있다. 한 명의 위대한 의사는 수천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지만, 한 명의 위대한 과학자는 수억명의 인류를 살릴 수 있다. 언젠가는 예전 '카이스트'처럼 어린아이들이 '과학자'라는 직업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방향을 가진, 과학자라는 직업을 꿈을 가질 수 있는 슬기로운 드라마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