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송의 어둠의경로]
[오피니언타임스=서은송]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을 이해하는 일이 가능할까. 그것도 전쟁이라는 거대한 고통을 이해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타인의 고통>에서 수전 손택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분쟁지역의 사진을 보면서 전쟁을 이해했다고 착각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카메라와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분쟁 지역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됐지만 손택의 지적처럼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일종의 스펙터클로 소비한다고 책에서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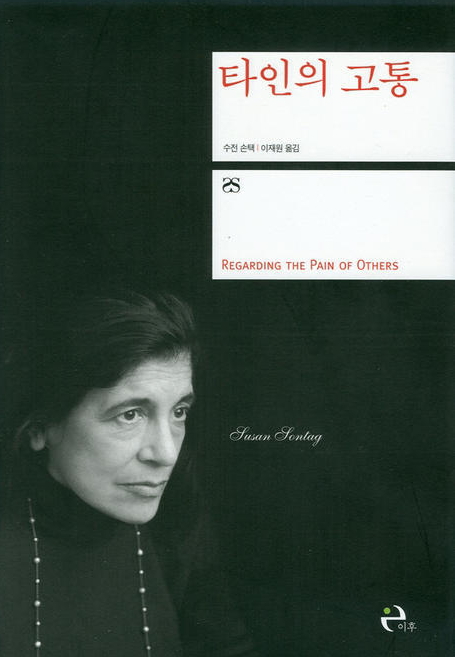
시를 쓰는 것은 내게 있어 엄청난 고통이었다. 많은 대학들과 백일장 심사위원들은 더욱 아름답고 달콤한 향을 가진 시를 원했다. 내가 써내린 시들은 전부 ‘타인의 희락’이자 곧 나의 고통이었다.
이 책을 읽을수록 ‘아름다운 시’와 ‘전쟁사진’은 서로 극과극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본질은 서로 통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기 좋은 시에서 관찰자들이 원한 것은 ‘그들의 희락’이었고, 자극적이고 강한 전쟁 사진’ 속에서 그들이 원한 것은 ‘타인의 고통이었다.
세계의 잔혹한 폭력을 마주하면서도 순간 연민을 느낄 뿐, TV광고마냥 쉽게 채널을 돌리는 현대인들. 마치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마주침으로써 그들의 무고함을 증명하려했던 것이 아닐까.
시간이 흐를수록 타인의 고통을 보여주는 이미지는 점점 쌓여갔고, 우리는 더욱 자극적인 사진을 원하게 되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 진부한 울림으로 치부되는 세상이다. 그런 사회 속에서 1년 전 쯤, 전세계를 울린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알레포 소년’을 기억하는가. 시리아 내전 폭격 현장에서 구조돼 먼지를 뒤집어쓴 채 앉아 있던 꼬마의 사진이었다. 머리 한쪽에는 딱딱히 굳은 피가 먼지와 함께 아이를 뒤덮고 있었다. 어쩌면 진부한 전쟁 모습에 스쳐 지나갈 수 있던 사진이었다. 그런데 왜 전세계 사람들은 그 사진에 동요하고 울었는가.
바로 그 아이가 울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점 없는 눈동자에 울지 않은 채 피와 먼지를 뒤집어 쓴 아이. 아마 그 아이가 죽거나 울고 있었더라면 기사화되지도 못했으리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어느 누가봐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고통을 모르는 아이’에 대해 사람들은 연민을 느꼈다.
더욱 잔인해져가는 세상이다. 타인의 고통을 담은 사진은 아무 생각 없이 한번에 지나가선 안 된다. 모든 통찰을 동원해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나는 타인의 고통 속에서 다큐를 사랑하게 되었다. 다큐를 보거나 들으면 마음의 안정을 느끼곤 한다. 다큐멘터리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사실적으로 담은 영상물이나 기록물’이다. 지금은 비록 구조적인 문제와 모순적인 사회에 대해 겨우 실눈을 뜬 정도이지만 산업문명의 패악질들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주는 다큐멘터리에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지식채널e와 같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뒤 불합리한 사회 문제를 편안히 앉아 감상하고 있다는 데 불편함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영상을 보면 ‘사실 편안하게 느끼면 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 비슷한 감정이 뒤따라온다.
내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가장 인간적이라고 느끼는 이유이자,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 또한 바로 타인의 고통 때문이다. 독자는 굶주려서 곧 죽을 것 같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심하게 훼손된 시신, 혹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사람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잔인하고 잔혹한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더 찾고 일종의 스펙타클로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타인의 고통이 단순히 이미지의 용도와 의미뿐만 아니라 전쟁의 본성, 연민의 한계, 그리고 양심의 명령까지 훨씬 더 절실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말이다.
다큐는 사람들의 수많은 짐들을 잊으려 애쓰지 않고 카메라를 통해 기억해 준다. 단순히 카메라에 사람들의 한숨을 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지 못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함께 기억해줄 수 있는 도구이다.
투쟁을 다룬 영화의 경우, 허구성이 들어간 단순한 영상적 기록이 될 뿐,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결국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직접 투쟁하고 현장에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사람들의 몫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다큐멘터리를 통해 분개한다 한들, 결국 투쟁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그들이 받는 피해를 대신 책임져 줄 수도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입을 대변해 저의 생각을 얘기하고 죄책감을 갖는 것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큐는, 찍는 사람에게도 보는 관객에도 인간적인 면모를 선물해준다. 그렇기에 단순한 영상적 기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다큐멘터리를 한다는 것은 잿더미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한줌의 희망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큐에서 비추는 진실이 사람들의 인간성을 일깨우고, 불편함을 키워 현실을 바꾸는 내일이 오길 바래본다.

서은송
2016년부터 현재, 서울시 청소년 명예시장
2016/서울시 청소년의회 의장, 인권위원회 위원
뭇별마냥 흩날리는 문자의 굶주림 속에서 말 한 방울 쉽게 흘려내지 못해, 오늘도 글을 씁니다.
| 오피니언타임스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