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복의 고구려POWER 28]
[오피니언타임스=김부복] ‘강행군’은 무리한 행군을 말한다. 합리적이지 못한 위험한 행군이다. ‘손자병법’은 강행군을 고집하면 싸움에 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00리 길을 휴식도 없이 주야로 강행군해서 적과 기선을 다투면, 장수가 적에게 사로잡히고 만다. 체력이 강한 병사만 앞서고, 약한 병사는 낙오해서 병력의 10%만 전장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50리 길을 강행군해서 적과 기선을 다투면, 선두부대에 있던 장수는 패하거나 좌절하게 된다. 병력의 50%만 전장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수나라 양제(煬帝)는 ‘손자병법’의 경고를 무시했거나 어쩌면 몰랐다. 양제는 고구려를 정벌한다며 군함 300척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라고 지시했다.
병사들은 오늘날의 산둥반도의 물속에서 작업해야 했다. 허리 아래에 구더기가 생기고, 혹독한 매질로 피고름이 흐를 정도였다. 그 바람에 10명 가운데 3∼4명이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
군량을 운반한다며 60만 대의 수레를 강제 징발했다. 길이 험했고, 운반은 힘들었다. 군량을 수송하는 길바닥에는 지쳐서 쓰러진 사람이 여기저기 널렸다.
그나마 군량을 싣고 온 소와 말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무리하게 수송한 군량을 ‘회원진’과 ‘노하진’이라는 곳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소, 말과 수레를 징발하고 인력까지 동원했으니 농사를 짓기 힘들어졌다. 그 결과 곡식 값이 폭등했다. 쌀 한 말 가격이 수백 전(錢)으로 치솟았다. 탐관오리들은 물가를 부채질했다. 생필품을 사재기했다가 비싸게 내놓으면서 아침저녁 사이에 물가가 여러 배나 치솟기도 했다.
전마(戰馬)를 갖추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말도 모자라게 되었다. 말 한 필 값이 10만 전에 달했다. 병기와 장비에 대한 검사도 수시로 실시했다. ‘관리 부실’이 적발되면 즉석에서 병사를 처형하기도 했다.
백성은 살아남기 위해 나무껍질을 벗겨 먹더니 잎까지 뜯어먹어야 했다. 잎이 모두 없어지자 나중에는 볏짚을 찧어 가루를 내어 먹기도 했다. 그것마저 부족해지자, 서로 잡아먹었다. 흙을 퍼먹는 백성도 있었다.
이랬으니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도망자가 속출했다. 도망자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도둑이 되기도 했다.

이때 유행한 노래가 있었다. ‘무향요동낭사가(無向遼東浪死歌)’다. 고구려 땅인 ‘요동’에 가서 헛되게 개죽음하지 말자는 노래였다.
“긴 창은 하늘의 절반을 가리고, 칼을 실은 수레는 햇빛을 받아 번쩍이네(長槊侵天半 輪刀耀日光)
산 위에서는 노루와 사슴을, 산 아래에서는 소와 양을 잡으며 살았는데(上山吃獐鹿 下山吃牛羊)
문득 들으니 관군이 와서 칼을 들고 전쟁터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다네(忽聞官軍至 提刀向前蕩)
그러나 요동에 가면 오직 죽음뿐, 머리는 잘리고 온몸에는 부상을(譬如遼東死 斬頭何所傷).”
노래가 유행한 것은 611년이었다. 그럴 만했다. 문제(文帝) 양견(楊堅)이 30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쳐들어갔다가 참패한 게 598년이었다. 불과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백성은 ‘고구려 공포증’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양제가 또 고구려를 치겠다며 백성을 혹사하니, 겁을 먹지 않을 수 없었다.
양제는 그래도 강행군을 했다. 113만 대군의 깃발이 무려 960리에 걸쳐서 나부꼈다. 이와는 별도로 ‘황제 친위대’의 행렬만 80리에 달했다. 합치면 1000리가 넘었다.
그렇지만 강행군의 결과는 참담했다. 양제 자신만 몰락했으면 그나마 괜찮을 뻔했다. 나라까지 무너져야 했던 것이다. ‘무향요동낭사가’는 마치 예언처럼 적중하고 있었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손이나 발을 잘라서 스스로 ‘불구자’가 되는 백성도 적지 않았다. 그래야 끌려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손발을 자르는 과거사’가 1300년 후 조선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었다.
“…의사(醫師)를 농락하여 가병(假病)으로 입원하고, 또는 일부러 화류병에 이염(罹染)하여 질병을 이유로 면하려고 기도하고, 그 중에는 스스로 수족을 다쳐 불구자가 되어 기피하려고 하는 자, 심한 것에 이르러서는…폭행∙협박의 거(擧)하기에 시간이 없으며… 특히 최근 주목할 것은 집단 기피 내지 폭행 행위로서 … 징용 기피를 위해 장정들이 결심대(決心隊)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식량, 죽창, 낫 등을 가지고 산정에 입농(入籠)하여 끝까지 목적 달성을 기도하고….” <日帝下强制人力收奪史 金大商 지음>
일제 때 일본은 자기들의 ‘제국의회’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었다. 한 명의 조선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혈안이었음을 보여주는 보고서였다.
강제징용이 견딜 만했다면 조선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멀쩡한 팔다리를 망가뜨리면서까지 피하려고 했을 리가 없었다. 도망자가 속출한 것도 닮은꼴이었다.
실제로, 조선 사람들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삽질을 시작해서, 어두워서 삽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식수’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 흙탕물로 갈증을 달래며 삽질을 계속해야 할 때도 있었다.
조선 사람들은 숙소에서 베개 대신 긴 통나무를 ‘공동 베개’로 사용해야 했다. 그 용도가 희한했다. 꼭두새벽부터 ‘통나무 베개’를 몽둥이로 두드려서 잠을 깨운 것이다. 그러면 머리가 울리는 바람에 아무리 몸이 무겁고 피곤해도 일어나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그런 숙소를 일본말로 ‘다코베야’라고 했다. ‘다코’는 문어다. ‘다코베야’는 ‘문어방’이라는 뜻이다. 문어는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다리를 하나씩 뜯어먹는데, 조선 사람들 역시 자기 몸을 갉아먹으며 일하다가 쓰러진다고 해서 생긴 말이었다.
급식은 말할 것도 없었다. 쌀알이 드문드문 박혀 있는 콩을 주먹만하게 뭉친 밥이었다. 또는 무와 홍당무가 섞인 밥이었다. 영양실조에 걸리고, 앓다가 쓰러져야 했다. 사망자가 속출했다.
어떤 철도 공사장에서는 조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다. ‘침목 하나가 조선 사람 하나’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다. 공사 현장은 조선 사람들의 ‘무덤’이었다.
그들은 사망자의 처리가 번거로워지자, 철도 교각에 시체를 넣고 시멘트로 발라 버렸다. 이것을 ‘인주(人柱·히토바시라)’라고 했다. ‘사람 기둥’이라는 얘기였다. 심지어는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은 사람까지 ‘콘크리트 처리’를 하기도 했다.
이랬는데도 일본은 ‘강제적인’ 징용은 아니었다고 오리발이다. 배상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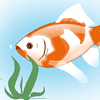
김부복
| 오피니언타임스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ews34567@opiniontimes.co.kr)도 보장합니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노가다는 자랑할일도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 건축일부터
심지어 까다롭기로 이름난 관급 공사장 일을 다녀본 경험으로 올리는 댓글입니다.
교각공사는 특히나 엄격한 관리감독이 따릅니다.
교각에 담배꽁초 하나라도 들어간것이 포착되면 헐어야 됩니다.
교각공사가 그만큼 까다롭다는 소린데 교각에 사람 시체를 넣어 버린다니
그저 놀라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