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언의 잡문집]
[청년칼럼=시언] 자체휴강시네마와의 처음을 기억한다. 2019년 3월, 시나리오 작가인 사촌형과 우리 동네에서 불콰하게 술을 마신 날이었다. 2차는 어디로 갈까 궁리하는데 형이 뜬금없이 영화관에 들르자고 했다. 오후 10시를 향해 치닫는 지금 예약도 안한 영화를 보자는 말이 황당했고, 영화관을 ‘들르자’는 표현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다. 영화관이 어디인가. 일단 영화 한편 보려면 상영작과 상영 시간을 일일이 확인하고, 적합한 좌석을 예약해야 한다. 멀기는 또 좀 먼가. 한 마디로 나에게 영화관은 상당한 귀찮음을 감수해야 갈 수 있는 귀찮은 장소였다. 그런 곳을, 그것도 술 먹고 ‘들르자’니. 들르자고 가볍게 말하면 귀찮은 일이 안 귀찮아지나, 속으로 삐죽거렸던 기억이 난다.
그땐 미처 알지 못했다. 내 원룸보다 조금 더 큰 단편영화 상영관이 내 마음의 아지트로 자리매김할 줄은. 그리고 그런 공간을 너무나 빨리 잃어버릴 줄은 더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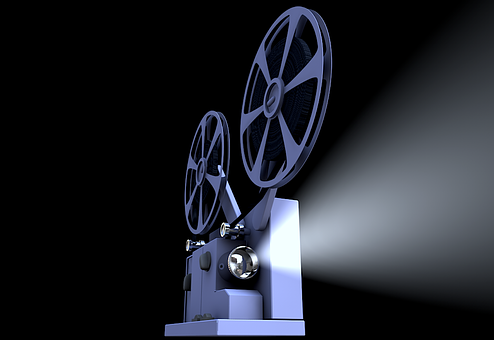
“여기 맞아?”
생각과 달리 영화관은 우리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지하 단칸방의 먼지 냄새와 팝콘 냄새가 기분 좋게 섞인 자체휴강시네마의 풍경은 사실 영화관보단 심야 북카페에 더 어울려 보였다. 귤색 백열등이 지하 단칸방의 어둠을 뭉근하게 비췄고, 4개 남짓한 테이블과 서가에는 『체 게바라 평전』, 『총,균,쇠』 따위의 책들이 무질서를 가장하며 정스럽게 쌓여 있었다. 좀 전까지의 불만은 까맣게 잊고 이 책 저 책 신나게 뽑아보는 사이 아이패드를 드신 사장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다.
“이번 달 상영작 중에서는 <다운>이 꽤 볼만해요. 배우들이 워낙 베테랑들이라 연기력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형님은 시나리오 작가시고 동생분은 영화 비평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진지한 분위기인 <다운>이 잘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작품도 둘러보시고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한 편당 3,000원. 사장님의 100% 개인 맞춤형 영화 큐레이션과 리필 가능한 카라멜 팝콘, 고급 홈시어터와, 무려 ‘무중력’ 의자가 완비된 작은 상영관을 홀로 독차지 할 수 있는 권한의 값이었다. 자체휴강시네마를 찾은 청년들은 하나뿐인 상영관이 빌 때까지의 대기 시간을 기꺼운 마음으로 지불했다. 나는 눅눅해진 카라멜 팝콘을 혀 위에서 굴리며 예감했다. 정둘 곳 없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이곳이 나의 아지트가 될 거라고.
그날 이후 자체휴강시네마는 정말 나의 아지트가 됐다. 헛헛해서 마신 술 때문에 더 헛헛해 져 버린, 그런 밤이면 나는 자체휴강시네마로 발길을 돌렸다. 과하게 편한 상영관 의자 때문에 어떤 날은 상영 시간 내내 곯아 떨어지기도 했다. 또 어떤 날은 30분짜리 영화를 보기 위해 한시간 반가량을 대기하기도 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그곳엔 언 마음을 녹여주는 백열등 빛이 있었고, 반쯤 식어 눅눅해진 카라멜 팝콘이 있었고, 어떤 조건을 대든 –가령, “오늘은 우울한 작품을 보고 싶어요” 따위의- 기가 막히게 알맞은 영화를 추천해 주시는 사장님이 계셨다. 그거면 족한 내 아지트였다.
나중엔 술자리가 파하고 쓸쓸해 지려들면 ‘자체휴강시네마 가야지’라며 마음을 토닥였다. 일종의 플라시보였을까. 아니면 흔들리는 나 자신을 다잡기 위한 의식이었을까. 탈진한 영혼을 잠시 누일 아지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꽤 견딜만해 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귀가길 위에서 적당히 술이 깨고 동네에 도착할 때쯤, 나는 자체휴강시네마 대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견딜만해진 마음에는 언제나 내일 해야 할 공부와, 써야 할 자기소개서, 마감이 닥친 칼럼 따위가 앵콜을 외치며 재등장했다. 오늘만 날인가. 그곳 덕분에 견딜만 해진 마음이, 나와 그곳을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역설이었다.
“진짜 기다려 주지 않는 거더라.”
간만의 통화에서 형은 그답지 않게 침체된 목소리로 자체휴강시네마의 폐관을 알렸다. 다음 주에 자체휴강시네마에서 접선하자는 일전의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 한 통화였다. 본인도 폐관 다음날에야 알았다고 그는 씁쓸해했다. 그럼 굳이 우리 동네에서 볼 필요 없겠다는 내 말을 형은 부정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겐 낡고 볼품없는 한 가게가, 누군가에겐 한 도시를 찾는 유일한 이유였다.
자체휴강시네마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11월 상영을 끝으로 장기 휴관에 들어갑니다”라는 문구가 팝업창에 표시됐다. 다른 장소에서의 재개관을 예고했으나 재개관 일정, 장소 모두 명시되지 않았다. 문득 나는 폐관 이틀전 저녁에 자체휴강시네마 앞에서 잠시 서성였던 20여초간을 떠올렸다. 나는 해야 할 일을 수행할 수 있을만큼 견딜만 했고, 여전히 미생인 내가 해야 할 일은 징그럽게 쌓여 있었다. 12월 초에 사촌형과 자체휴강시네마에서 모이기로 한 약속도 좋은 핑계가 돼주었다. “에이, 오늘만 날인가”라는 혼잣말을 끝으로 나는 미련없이 나의 아지트를 등졌다. 많은 이별이 그렇듯 그게 마지막인지도 모르는 채 였다.
정말 불이 꺼져버린 옛 아지트 앞에서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내가 자체휴강시네마를 떠올릴 때 받았던 ‘언제든 들를 수 있다’는 그 편안함은, 안일함의 미화된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설령 그곳이 마실가듯 가볍게 들를 수 있는 곳이 아닌 불편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랑한다면 기꺼이 감수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언제든 들르라는 사장님의 말을 나는 정말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로 속 편히 믿어 버렸다. 뒤늦게 검색해본 사장님의 5월 인터뷰에는 “(재정난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한탄이 포함돼 있었다. 한번이라도 자체휴강시네마를 검색해 봤다면 볼 수 있는 인터뷰였다. 오늘만 날이었구나. 지금껏 그렇게 많은 걸 잃어버려 왔으면서도 나는 여전하구나. 단 한 걸음 늦게 깨달아 버린 자가 치르는 댓가는 언제나 뼈아픈 후회였다.
자체휴강시네마의 재개관이 언제, 어디서 이뤄질지, 이뤄지긴 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가끔은 나의 아지트가 지금보다 훨씬 먼 곳에서라도 재개관하는 상상을 해본다. 그렇다면 그곳은 이전과 달리 달리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가며 가야 할, 멀찍이 떨어진 공간이 될테다. 가던 길에 ‘들를 수’ 없는 곳이기에 귀찮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귀찮음 많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갈 것’이다.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사랑해 마지않는 나의 아지트를 향해서.

시언
철학을 공부했으나 사랑하는 건 문학입니다. 겁도 많고 욕심도 많아 글을 씁니다.
| 오피니언타임스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