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복의 고구려POWER 34]
[오피니언타임스] 조선 말, 아손 그렙스트라는 스웨덴 출신 기자가 우리나라를 취재했다. 부산항에서 느낀 첫 인상은 조선 사람들의 건장한 체격이었다. 그는 돌아가서 ‘코레아, 코레아’라는 책을 집필했다.
“코레아 사람들은 일본 사람보다 머리통이 하나 정도 더 있었다. 신체가 잘 발달되었고 균형이 잡혀 있었다. 태도는 자연스러웠고 여유가 있었다. 얼굴을 똑바로 하여 거침이 없이 당당하였다.…”
조선 말, 우리나라를 여행했던 영국 할머니 이사벨라 비숍도 비슷한 얘기를 썼다.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잘생긴 종족이다. 체격도 좋은 편이다. 성인남자의 평균 신장은 163.4cm다. 여자의 평균 신장은 확인할 수 없다.… 힘이 세어서 짐꾼들에게 45kg의 짐은 보통으로 여겨질 정도다. 그들은… 모두 눈에 띄게 잘 걷는다.”
또 조선 말, ‘한국사람 엿보기’라는 책을 쓴 미국 사람 잭 런던은 우리를 삐딱한 시각으로 깎아내렸다.
“한국 사람에게는 기개가 없다.… 지구상의 어떤 민족 중에서도 의지와 진취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장 비능률적인 민족이다.”
그러면서도 런던은 “그들의 상전인 ‘왜놈’들을 몸집으로 훨씬 능가하는, 근육이 발달된 건장한 민족”이라는 말을 빠뜨릴 수는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키 크고, 체격 당당하고, 힘도 강한 민족이었다. 체구가 큰 서양 사람도 우리를 내려다볼 수 없었다.
키 크고 체격도 큰 만큼 먹는 것도 대단했다. 비숍 할머니는 우리 식성을 보고 이렇게 놀라고 있었다.
“…한 끼니에 1.4㎏ 이상의 질긴 고기를 먹어치우는 것을 목격했다.… 1인분이라는 것이 결코 적지 않은데도 3∼4인분을 먹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는데… 서너 명이 모이면 한자리에서 껍질 벗기지 않은 20∼25개의 복숭아나 참외가 없어지는 일은 다반사다.”
중국의 옛 기록에도 우리는 체격이 당당했다.
“그들은 체격이 크고 용감하다. 그러면서도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없으며 밤낮 없이 모여 술 마시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고 했다.
“고구려에서는 절할 때에는 한쪽 다리를 꿇고, 걸을 때에는 모두 달음박질치듯 한다”고도 기록했다.
자기들과 체격이 비슷했더라면, 특별히 체격이 크다고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숍 할머니는 나라가 기울던 조선에서도 활기가 넘쳤던 ‘고구려의 유전자’를 발견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 당당한 체격의 고구려는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조 추모왕은 ‘천제의 아들(天帝之子)’ 또는 천제를 대행하는 ‘해와 달의 아들(日月之子)’이었다. 따라서 그 백성은 ‘천손민(天孫民)’이었다. 고구려의 천하관은 광개토대왕릉비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업적이 황천(皇天)에 달하고 위력은 사해(四海)에 떨쳤다”고 했다. 당연히 주변 국가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를 이은 발해도 다르지 않았다. 발해 2대 임금 무왕은 9년(727)에 일본에 첫 사신을 파견했다. ‘국서’에 “발해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부여 이래의 오랜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고 했다. 일본 임금은 답서에서 “귀국이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이전 고구려 때와 같이 우리와 국교를 가지게 된 것을 기뻐한다”고 쓰고 있었다.
발해 3대 문왕은 758년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려국왕 대흠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왕은 771년 일본에 또 국서를 보내면서 “발해 왕실은 ‘천손’이다. 일본과의 관계를 ‘장인과 사위’로 할 것”을 요구, 일본이 발끈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그랬던 일본이 되레 우리에게 ‘우월감’을 가진 적도 있었다. ‘머리통 하나가 작은’ 일본 사람들이 이른바 ‘일등국민’이 되더니 기고만장한 것이다. 타야마 카타이((田山花袋)는 만주와 조선을 여행하고 나서 이런 글을 읊었다.
“지금은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지만 옛날에는 조선이 도시였고, 일본은 시골이었던 적이 있었다.… 역시 일본의 옛날은 조선과 똑같았다. 조선의 풍속과 느낌이 그대로 후지와라나, 헤이안 조에 모방되어 갔다.… 조선은 비유해보면 메이지 10년 전후의 상태인 것으로 생각한다….”
‘메이지’ 10년 전후라면 1876∼1877년이다. 타야마가 이 글을 쓴 것은 1914년이다. 따라서 타야마는 조선이 일본보다 40년 정도 뒤졌다고 깔본 것이다.
‘일등국’ 일본은 ‘차별 분업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군사와 ‘대규모 기업’은 일본이, 상업과 노동은 중국이, 논농사는 조선이, 목축업은 몽골이 각각 맡아서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었다.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한국인 비판’의 저자 이케하라 마모루(池原衛)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100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격차가 날이 갈수록 좁아지기는커녕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케하라는 “지금부터라도 한국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죽을힘을 다해 달리지 않으면 영원히 따라잡지 못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흰쥐의 해’인 경자년(庚子年) 새해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했는데도, 나아질 구석이 보이지 않는 새해다. 밖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해를 넘기며 ‘진행형’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도 ‘진행형’이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허풍’ 비슷하게 넘어갔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으름장이다.
그렇다면, 안에서라도 똘똘 뭉쳐서 중심을 잡아야할 텐데 정치판은 연말도 연시도 잊은 채 오로지 삿대질이다. 경제성장률은 ‘2% 턱걸이’로 허덕이는 현실이다. 그래서 고구려의 우월감이나 뒤져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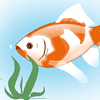
김부복
| 오피니언타임스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ews34567@opiniontimes.co.kr)도 보장합니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이미 아베 덕분에 기술독립해 버린 상태고
문재인 보유로 싱가폴도 동남아도 인도도 사우디도 동유럽도 러시아도 영국도 일본 버리고 한국과 경제교유 중이고 원하던데....
고구려는 북한이니 북한만 구워삶아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에너지만 끌어오면 30%의 에너지와 무역비가 절감 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