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참, 댓글창에 기레기네 뭐네 하는 말들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모 언론사 인턴기자로 입사했을 때 교육을 맡았던 한 선배의 당부였다. 선배의 당부가 단순한 노파심에서 기인한 것만은 아니란 사실은 금세 드러났다. 우리 새파란 인턴 기자들이 ‘기레기’란 단어에 익숙해 지는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이걸 기사라고 썼냐 기렉아’, ‘넌 돈 쉽게 벌어서 좋겠다 기렉아’, ‘진짜 한국 기레기들 노답’ 등의 댓글들이 병아리 인턴기자들에게 쏟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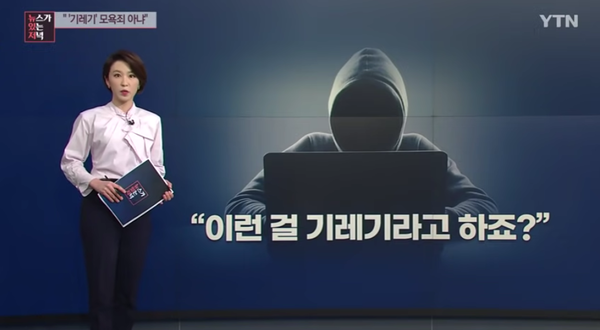
변명할 생각은 없다. 계약직 6개월 동안 내가 써낸 기사들의 절대 다수는 내가 봐도 서글픈 수준이었다. 무엇이 민주주의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정보인가에 대한 고민보단, 어떻게 제목을 뽑아야 클릭하고 싶어질까를 고민한 나날들이 더 많았다. 저널리즘의 ‘ㅈ’도 아깝다는 말은 좀 심한 자괴인가 싶다가도, 항변의 근거들을 톺아보면 반격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곤 했다. 어떤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의 비난이나 비판에 기분이 나빴다면, 내가 그 비난에 일부라도 동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기레기’란 말은 익숙했되, 아팠다.
그러나 6개월짜리 밥줄을 지키는데 ‘악플’보다 무서운 건 ‘무플’이었다. 인턴기자 입사 전까지의 나는 졸업 후 수년을 신림동 고바위 위 단칸방에서 까먹은 철학과 출신 룸펜이었다. 농사 짓는 부모님께 더는 손 벌릴 수 없다는 각오로 각종 구직 사이트를 뒤졌다. 일해서 밥값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았다.
그런 내게 반년 동안이나마 월급을 주겠다고 나선 회사와 부서가 요구한 바는 명확했다. 조회 수. 조직의 고충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었다. 엄연한 사기업인 언론사는 조회 수를 통한 광고 수익 없인 구성원들에게 밥값을 지급할 수 없다. 이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저널리즘의 본분에 충실한 기사들이 조회 수까지 높다면 더할 나위 없으리라. 그러나 늘 그렇듯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장대했다. 어차피 흔히 자극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기사들에 공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도 말할 수 없을 터였다. 있는 그대로 묘사했음에도 충분히 자극적인 비극들이 이 사회엔 너무 많다.
나는 조회 수를 따라가는 기사들을 성실히 써내려갔다. 자괴도, 변명도 없는 사실이다. 학부 때 어깨 너머로 배운 저널리즘의 가치를 흉내라도 내기엔, 뒤늦게나마 어른으로서의 의·식·주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너무 소중했다.
그래도 아주 가끔은 조회 수를 사실상 포기한 채 각종 선행들에 관한 기사를 발제했다. 홀연히 관공서에 나타나 빈민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수백만원을 두고 사라진 무명 독지가의 이야기 같은 것들. 잘해봐야 조회 수 500회가 넘을까말까 한 아이템들을 발제하고 멘트를 따겠다며 하루를 보냈다. 왜인지 쓰지 않고선 이 일을 지속해 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선한 사람들의 선한 이야기를 보다 널리 알리는 나팔수가 됐다는 일말의 자긍심이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고해성사가 아니었나 싶다. 이 사회의 행복보단 분노·불안·적개심과 같은 감정들의 총량을 늘리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시절이었다. 그런 내 고민을 헤아렸던 걸까. 당시 데스크는 내 고해성사식 발제를 가로막지 않았다.
인간의 뇌엔 ‘부정 편향’이란 특성이 있다고 한다. 기분 좋고 긍정적인 정보보단, 위험하고 기분 나쁜 정보에 몰입하게 되는 진화심리학적 경향성의 일종이라고 들은 바 있다. 크고 작은 선행에 관한 기사들보다, 자극적이고 불쾌한 사람 혹은 사건 관련 기사를 클릭하기 쉬운 이유일 것이다. 회사를 떠난지 수년째인 지금, 고해성사 삼아 썼던 선행 관련 기사의 조회 수가 높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한다. 기자들이 앞다퉈서 이 사회의 숨은 선행들을 발굴해내고, 그 노력이 조회 수와 함께 한 달의 밥값으로 돌아오는 사회를. 그때도 ‘기레기’란 댓글이 달릴까. 설령 달린다고 해도, 그땐 다소나마 웃어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INFP의 쓸데없는 망상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