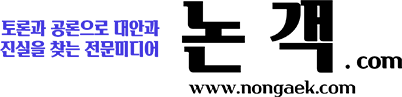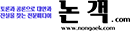-이제희/자유기고가
잊힌 이름 유팽로를 다시 불러야 하는 이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은 순식간에 전쟁의 먹구름 아래 가라앉았다. 성이 무너지고 고을이 불타는 비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한 이는 이름난 장수도, 조정의 대신들도 아니었다. 그 앞선 직감과 책임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은 평범한 사림, 월파 유팽로였다.
전쟁 소식이 호남에 닿자마자 유팽로는 누구보다 먼저 의병을 일으켰다. 명령도, 지시도 없었다. 그를 움직인 힘은 오직 하나였다. “누군가는 먼저 나서야 한다”는 양심의 부름, 책임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선비의 결기였다.
금산성에서 그는 적은 병력과 빈약한 장비로 왜군의 진격을 막아섰다. 승산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는 가능성보다 책임을 선택했다. 한 사람의 결단이 공동체를 어떻게 일깨우는지를 보여준 순간이었다. 끝내 장렬히 산화했지만, 그의 죽음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호남 전역에 저항의 불꽃을 퍼뜨리는 불씨가 되었다.
금산성의 패배가 남긴 더 깊은 승리
표면적으로 금산성 전투는 패배였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패전 속에 승리보다 더 큰 의미를 품기도 한다. 유팽로가 흘린 피는 호남을 넘어 조선 각지로 퍼져 의병 봉기의 촉매제가 되었고, 들불처럼 번져 나간 의병 활동은 왜군의 전략을 흔들며 국가 방어의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가 조직한 호남연합의병은 금산에서 무너졌지만, 오히려 그 패배는 의병 정신의 순수성과 강인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이라는 신념 아래 다시 일어섰다. 금산성은 패전의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의 정신이 태어난 자리였다.
오늘날 학자들은 유팽로의 죽음을 단순한 전투의 실패가 아닌, 민중과 사림이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집단적 자각을 일깨운 ‘정신적 기점’으로 평가한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가 증명한 것은 무력의 우위가 아니라 ‘의지의 강함’, ‘마음의 강함’, 그리고 ‘공동체의 강함’이었다.
이 진실은 지금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위기 앞에서 개인의 선택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선택이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금산성의 이야기는 그 오래된 진리를 가장 또렷하게 증명하는 역사적 응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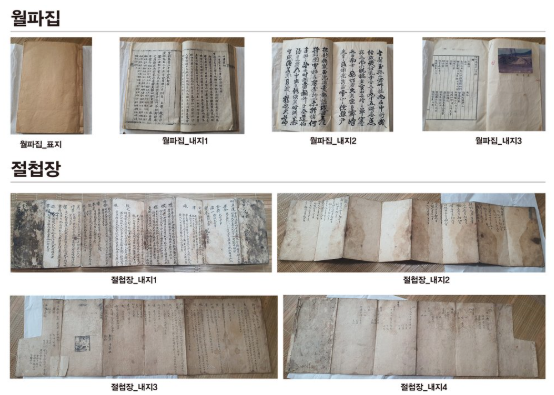
기억의 들녘에서 되살아나는 조용한 울림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전해짐’이다. 오늘 유팽로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의 도산사다. 그의 위패를 모신 전각과 생가터, 나라에서 하사한 비석이 자리한 이곳은 단순히 과거 인물을 기리는 공간이 아니다. ‘기억이 숨 쉬는 자리’이자, 한 개인의 결단이 역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산 교육의 현장이다.
도산사 앞 들녘에는 그의 애마가 장군의 잘린 목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와, 주인을 잃은 슬픔 속에 스스로 생을 마쳤다는 전설을 품은 의마총이 서 있다. 말이 주인을 위해 죽음을 택했다는 이 이야기에는 단순한 비극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충절과 의리, 공동체적 사랑이라는 가치가 상징처럼 응축된 전설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유팽로의 삶은 더욱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한층 숭고한 빛을 얻는다.
도산사와 의마총은 오늘의 우리에게 조용히 묻는다. '한 사람이 지킨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유팽로의 결단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낡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기록 속에서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살아 있는 메시지다. 월파 유팽로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다. 임진왜란의 가장 혹독한 순간, 평범한 사림이 시대를 일깨운 지도자로 변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가 남긴 것은 전공의 기록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다.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용기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책임 앞에 선 ‘보통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희생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금산성에서 그의 생은 끝났지만, 그의 정신은 결코 소멸하지 않았다. 도산사와 의마총이 그러하듯 그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 있고, 그의 선택은 오늘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택을 요구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잊힌 이름, 유팽로를 다시 불러야 한다. 그의 용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며.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