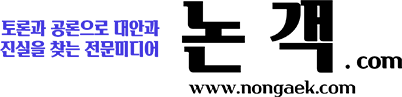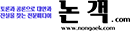'언컨퍼런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회의를 열면서도 정작 회의(懷疑)는 하지 않았다. 왜 꼭 이 순서여야 하는지, 왜 발표자와 청중이 나뉘어야 하는지, 왜 시간표에 갇혀야 하는지. 언컨퍼런스(Unconference)라는 단어가 흥미로운 건, 그것이 부정의 접두사 'un-'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기존을 뒤집는다(un-conference)는 이 조어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당연시해온 것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를 고백한다. 그것을 전복하려면 아예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다.
언컨퍼런스의 원칙은 급진적이리만치 단순하다. "나타난 사람이 바로 올바른 사람이다",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시작되는 때가 바로 적절한 때다", "끝날 때가 끝나는 때다". 계획과 통제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특히 인상적인 건 '두 발의 법칙(Law of Two Feet)'이다. 배우지도, 기여하지도 못한다고 느끼면 언제든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원칙. 이것은 단순한 이동의 자유가 아니다.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는 선언이다. 한국의 회의 문화에서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가. 우리는 지루한 회의에서도, 의미 없는 세미나에서도, '예의상' 끝까지 앉아있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다.
언컨퍼런스에 대한 반대 논거도 물론 있다. 의제를 정하지 않으면 산만해지지 않을까? 준비 없이 진행하면 알맹이 없는 수다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데 정작 경계해야 할 것은 너무 정답찾기에만 골몰하는 태도 아닐까. 완벽하게 통제된 일방향 강연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정연한 형식과, 박제된 지식과, 침묵하는 청중이다.
모두가 호스트이자 참가자라는 말은, 곧 모두가 회의의 형식과 내용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뜻이다. 이것은 회의 방식의 변화를 넘어, 지식 생산과 공유에 대한 철학의 전환이다. 연사와 청중이라는 위계, 전달자와 수용자라는 구도, 그 익숙한 구분에 물음표를 찍는 것. 언컨퍼런스는 바로 그 당연함에 대한 의심이다.
흥미롭게도 이 원칙들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닮아있다. 참여자 중심, 수평적 소통, 공동의 책임.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시대, 우리는 작은 회의실에서라도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을 해볼 수 있다. 불완전하고 때로 혼란스럽겠지만, 완벽하게 통제된 침묵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살아있는 대화가 낫지 않을까.
결국 언컨퍼런스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다. 완성된 지식을 전달받는 대신 함께 탐색하려는 자세, 답을 찾기보다 질문을 나누려는 의지, 그리고 실패할 자유와 즉흥적일 용기. 다음 회의 초대장을 받거든 한번 물어보자. 이 자리에서 나는 청중인가, 참여자인가. 그리고 이 회의에 대해 회의해본 적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두 발의 법칙'인지도 모른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